|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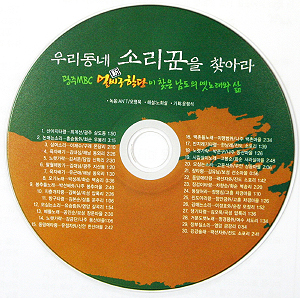 |
 |
| ▲ 책 안에 든 음악CD. | <목 차>
남도땅 구석구석, 동네 소리꾼들
눈코입귀 다 갖춘 재야 소리꾼의 <쑥대머리>
화순 백암리 박복수 18
어디서 불러도 자신있게 나오는 <댕기타령>
곡성 압록리 김오묵 22
의미가 짚은 서사민요 <베틀노래>
보성 장운마을 공인순 26
발군의 <시집살이노래>
화순 서라실마을 고봉순 32
약장시 굿판 휩쓴 <방구타령>
장흥 운주리 김본순 37
무속 음악가의 맛뵈기 <화투타령>
화순 벽송리 황옥진 42
강강술래 본향에서 맛보는 토장국맛 <육자배기>
해남 우수영 김내심 46
무속 예술가의 못다 부른 <강강술래> 앞소리
신안 비금도 유점자 50
명절 놀이로 되살아난 <와우리 광광술래>
담양 신학리 김서운 55
한두 시간으로는 못다 하는 <아리랑타령>
화순 복암리 유영자 60
죽을 때나 잊어불랑가 싶은 <옛 노래들>
광주 지산동 김대님 64
좌중 휘어잡는 보성의 만담소리꾼
보성 선소마을 김유남 69
인적없는 산속에 이름없는 꽃 <엿타령 장타령>
진도 돈지리 조오환 78
민요마을 소포리에서나 들을 수 있는 <반지락타령>
진도 소포리 한남례 82
한이 담기지 않은 <육자배기> <흥타령>이 있으랴
진도 소포리의 단짝 하귀심과 곽순경 87
아직도 소포리에 살아 있는 판소리 <숙영낭자전>
진도 소포리 박병임 92
400여 년 뱃일꾼들의 노래 <거문도 뱃노래>
여수 거문도 정경용 96
백년 묵어가는 지게목발 소리 <산아지타령>
광주 삼도동 최계선 100
이종가면 끝까지 메겨뒤꼈던 <상사소리>
해남 우수영 유근애 104
내가 있어 되찾은 <갈곡 들노래>
영암 갈곡리 유승림 108
가난했던 시절을 덮어준 소리 <상동 들노래>
무안 상동마을 고윤석 112
거짓없이 살아온 아버지의 자랑 <금과 들노래>
순창 모정리 이정호 117
나주 들녘에서 3대를 이어가는 <백촌 들노래>
나주 백촌마을 이맹범 122
소리 선생의 애창곡 <갈까부다>
나주 봉추마을 박만배 128
판소리도 민요 가사로 변주하는 <봉추 들노래> 소리꾼
나주 봉추마을 박선배 133
촌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장한 <추월만정>
담양 주산리 정병태 138
50∼60명을 출상해 보낸 관록의 <상여소리>
구례 당동마을 이재수 143
소리가 살아있는 동네 동네들
한정없이 나오는 ‘아리랑 알딱궁 쓰리랑 조대통’-고흥 차경마을 150
궁벽진 농촌 마을의 장밋빛 희망가-나주 봉추마을 154
놀 줄 아는 마을-영암 금강리 158
튼튼한 우리 소리, 튼튼한 공동체의식-화순 우봉리 162
수준급 옛 노래 즐비한 미래형 전원 마을-나주 동산마을 166
<광양 전어잡이노래>의 고향에서 쏟아진 발군의 옛 노래들-광양 신답마을 171
와우리 딸기의 명성 잇는 <광광술래>의 장관-담양 와우리 176
<모기노래> <징검이타령>-똑소리 나는 민요의 성찬-화순 벽송리 180
구구절절 서러운 산골마을 <시집살이노래>-곡성 압록리 186
남원 소리의 명불허전(名不虛傳)-남원 사석리 191
장구 치고 마이크 대면 궁둥이춤이 나오는-남원 방동리 196
민요 생태도 우수한 ‘쇠똥구리 마을’-장흥 운주리 199
<육자배기>가 지천, 진도 민속의 백가쟁명(百家爭鳴)-진도 소포리 204
<우수영 아리랑>이 살아있는 ‘민요 독립 자치구’-해남 우수영 215
스펙트럼 다양한 민요마을, 전승력까지 갖추다-화순 도장리 220
동네 동네 다니며 드는 생각들
저잣거리에서 회자되는 ‘민중적인’ 프로그램이고자 228
한결같은 삶의 정경이 펼쳐지는 곳, 재래시장 231
TV가 중매하는 현대판 중로보기 233
항꾼에 모여 놀아보자는 것이제 235
<진도아리랑>은 전라도의 민중가요다 238
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를 아시나요? 245
자본주의 시대 민속 유감-해남 <우수영 강강술래> 248
여성민요의 진국 <시집살이노래> 251
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소설책 같은 여인들의 생애담 257
앞소리꾼 묻히면 이 소리도 따라 묻히리 260
오래 오래 살아 숨쉬어라 <갈곡 들노래> 263
빈틈없는 짜임새 <금과 들노래> 266
정든 이웃을 하늘로 보내는 소리, <상여소리> 270
초야에 묻혀 사는 박동실의 제자 276
아짐들, 농촌 문화의 주체로 나서다 279
“사사(師事)하고 계십니까?” 281
사람이 무형문화다 283
노랫말과 악보 모음 | 


